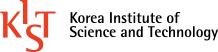Result
게시물 키워드"KIST"에 대한 4647개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유리 대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납 유출 방지
- 자가치유 고분자 활용 레고처럼 쌓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마리 (그림1) 자가치유 고분자 이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 성분이 물에 녹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막기 위한 소재 기술이 소개되었다. ○ 기존 딱딱한 유리 대신 가볍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열과 수분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것은 물론 외부 충격으로 소재가 찢어져도 자가치유를 통해 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 자가치유 고분자로 감싼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납 유출 차단 효과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김인수 박사 연구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동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등이 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축/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세종펠로우쉽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29일 게재되었다.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하여 외부환경과의 차단을 위해 유리 기반의 봉지(encapsulation) 공정을 거치고 있다. ○ 하지만 봉지용 유리는 얇아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유리를 활용하기에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연구팀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 수소결합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PDMS 기반의 자가치유 고분자를 봉지막과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별도 추가 공정 없이 납 화합물 유출 방지효과와 신축성을 모두 얻는데 성공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로 봉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우박으로 인한 충격을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뒤 물에 넣고 흘러나온 납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 납 화합물의 유출량은 0.6 ppb 수준으로 나타나 5.6 ppm 수준의 기존 유리 방식 봉지기술 대비 ~5,000배 가량 높은 납 유출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다. □ 한편 스스로 접합이 가능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의 특성을 이용,납땜 공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자를 마치 블록을 쌓듯 포개는 방식으로 원하는 광전소자 모듈을 구현할 수 있어 개인용 휴대기기, 신체 부착형 기기 등의 응용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물을 잘 투과시키고 열에 취약한 자가치유 고분자의 내구성을 개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리 대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납 유출 방지
- 자가치유 고분자 활용 레고처럼 쌓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마리 (그림1) 자가치유 고분자 이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 성분이 물에 녹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막기 위한 소재 기술이 소개되었다. ○ 기존 딱딱한 유리 대신 가볍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열과 수분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것은 물론 외부 충격으로 소재가 찢어져도 자가치유를 통해 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 자가치유 고분자로 감싼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납 유출 차단 효과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김인수 박사 연구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동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등이 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축/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세종펠로우쉽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29일 게재되었다.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하여 외부환경과의 차단을 위해 유리 기반의 봉지(encapsulation) 공정을 거치고 있다. ○ 하지만 봉지용 유리는 얇아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유리를 활용하기에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연구팀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 수소결합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PDMS 기반의 자가치유 고분자를 봉지막과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별도 추가 공정 없이 납 화합물 유출 방지효과와 신축성을 모두 얻는데 성공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로 봉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우박으로 인한 충격을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뒤 물에 넣고 흘러나온 납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 납 화합물의 유출량은 0.6 ppb 수준으로 나타나 5.6 ppm 수준의 기존 유리 방식 봉지기술 대비 ~5,000배 가량 높은 납 유출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다. □ 한편 스스로 접합이 가능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의 특성을 이용,납땜 공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자를 마치 블록을 쌓듯 포개는 방식으로 원하는 광전소자 모듈을 구현할 수 있어 개인용 휴대기기, 신체 부착형 기기 등의 응용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물을 잘 투과시키고 열에 취약한 자가치유 고분자의 내구성을 개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리 대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납 유출 방지
- 자가치유 고분자 활용 레고처럼 쌓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마리 (그림1) 자가치유 고분자 이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 성분이 물에 녹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막기 위한 소재 기술이 소개되었다. ○ 기존 딱딱한 유리 대신 가볍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열과 수분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것은 물론 외부 충격으로 소재가 찢어져도 자가치유를 통해 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 자가치유 고분자로 감싼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납 유출 차단 효과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김인수 박사 연구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동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등이 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축/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세종펠로우쉽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29일 게재되었다.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하여 외부환경과의 차단을 위해 유리 기반의 봉지(encapsulation) 공정을 거치고 있다. ○ 하지만 봉지용 유리는 얇아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유리를 활용하기에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연구팀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 수소결합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PDMS 기반의 자가치유 고분자를 봉지막과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별도 추가 공정 없이 납 화합물 유출 방지효과와 신축성을 모두 얻는데 성공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로 봉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우박으로 인한 충격을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뒤 물에 넣고 흘러나온 납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 납 화합물의 유출량은 0.6 ppb 수준으로 나타나 5.6 ppm 수준의 기존 유리 방식 봉지기술 대비 ~5,000배 가량 높은 납 유출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다. □ 한편 스스로 접합이 가능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의 특성을 이용,납땜 공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자를 마치 블록을 쌓듯 포개는 방식으로 원하는 광전소자 모듈을 구현할 수 있어 개인용 휴대기기, 신체 부착형 기기 등의 응용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물을 잘 투과시키고 열에 취약한 자가치유 고분자의 내구성을 개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리 대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납 유출 방지
- 자가치유 고분자 활용 레고처럼 쌓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마리 (그림1) 자가치유 고분자 이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 성분이 물에 녹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막기 위한 소재 기술이 소개되었다. ○ 기존 딱딱한 유리 대신 가볍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열과 수분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것은 물론 외부 충격으로 소재가 찢어져도 자가치유를 통해 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 자가치유 고분자로 감싼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납 유출 차단 효과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김인수 박사 연구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동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등이 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축/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세종펠로우쉽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29일 게재되었다.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하여 외부환경과의 차단을 위해 유리 기반의 봉지(encapsulation) 공정을 거치고 있다. ○ 하지만 봉지용 유리는 얇아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유리를 활용하기에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연구팀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 수소결합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PDMS 기반의 자가치유 고분자를 봉지막과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별도 추가 공정 없이 납 화합물 유출 방지효과와 신축성을 모두 얻는데 성공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로 봉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우박으로 인한 충격을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뒤 물에 넣고 흘러나온 납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 납 화합물의 유출량은 0.6 ppb 수준으로 나타나 5.6 ppm 수준의 기존 유리 방식 봉지기술 대비 ~5,000배 가량 높은 납 유출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다. □ 한편 스스로 접합이 가능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의 특성을 이용,납땜 공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자를 마치 블록을 쌓듯 포개는 방식으로 원하는 광전소자 모듈을 구현할 수 있어 개인용 휴대기기, 신체 부착형 기기 등의 응용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물을 잘 투과시키고 열에 취약한 자가치유 고분자의 내구성을 개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리 대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납 유출 방지
- 자가치유 고분자 활용 레고처럼 쌓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실마리 (그림1) 자가치유 고분자 이용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 봉지(encapsulation) 공정 □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는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 성분이 물에 녹아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막기 위한 소재 기술이 소개되었다. ○ 기존 딱딱한 유리 대신 가볍고 유연한 자가치유 소재로 열과 수분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구부리거나 늘이는 것은 물론 외부 충격으로 소재가 찢어져도 자가치유를 통해 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 자가치유 고분자로 감싼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의 납 유출 차단 효과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김인수 박사 연구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동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등이 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축/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세종펠로우쉽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29일 게재되었다.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열과 수분에 취약하여 외부환경과의 차단을 위해 유리 기반의 봉지(encapsulation) 공정을 거치고 있다. ○ 하지만 봉지용 유리는 얇아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유리를 활용하기에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응용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연구팀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 수소결합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PDMS 기반의 자가치유 고분자를 봉지막과 전극소재로 적용하여 별도 추가 공정 없이 납 화합물 유출 방지효과와 신축성을 모두 얻는데 성공했다. ○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로 봉지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우박으로 인한 충격을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뒤 물에 넣고 흘러나온 납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 납 화합물의 유출량은 0.6 ppb 수준으로 나타나 5.6 ppm 수준의 기존 유리 방식 봉지기술 대비 ~5,000배 가량 높은 납 유출 차단 효과를 확인하였다. □ 한편 스스로 접합이 가능한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의 특성을 이용,납땜 공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자를 마치 블록을 쌓듯 포개는 방식으로 원하는 광전소자 모듈을 구현할 수 있어 개인용 휴대기기, 신체 부착형 기기 등의 응용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물을 잘 투과시키고 열에 취약한 자가치유 고분자의 내구성을 개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소자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The KIST Story 전자책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The KIST Story: The Birthplace of Korea's Industrical Development의 전자책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https://kiststory.tistory.com/1875 이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KIST,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상온 동작 포터블 양자컴퓨터 과학기술대전 공개
- 자동 검체 추출 로봇, 격리 중환자실 치료장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코로나 대응 기술도 눈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은 일산 KINTEX 1전시장 2, 3홀에서 12월 22일(수)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혁신적 과학기술 성과를 집대성하고 국가첨단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KIST는 상온 동작 포터블 양자컴퓨터(한상욱 단장), 세계 최초 소금의 전기화학적 활성화를 이용한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정경윤 센터장),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 검체 추출 로봇시스템(이종원 선임연구원) 등 9건의 연구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1] 상온작동 포터블 양자컴퓨터 특히 이번 과학기술대전에서 KIST는 KRISS, ETRI, SKT,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첨단전략기술존 내에 ‘양자’관을 설치해 양자기술에 대한 산·학·연의 연구 성과와 비전을 홍보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KIST는 기존 극저온에서만 구동되는 타 양자컴퓨터들과는 달리 상온, 대기압에서 동작이 가능한 양자컴퓨터를 중국에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여 전시에 선보였다. 이 양자컴퓨터는 다이아몬드 NV센터 큐비트를 사용하여 상온, 대기압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사진 2] KIST 정호중 선임연구원이 상온 동작 이동가능한 양자컴퓨터 동작원리를 양자 부스 방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KIST 양자정보연구단 한상욱 단장은 “이번 전시에 선보인 KIST 양자컴퓨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라며, “현재는 IBM, 아마존 등 해외 양자컴퓨터만 체험할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컴퓨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3] KIST 방역로봇사업단이 개발한 실시간으로 콧구멍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 시스템 이 외에도 KIST는 연구개발관에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 검체 추출로봇시스템, 격리 중환자 치료장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코로나 대응 기술과 지능형 물품이송 및 배달로봇 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윤석진 원장은 “이번 과학기술대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었지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KIST는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미세먼지와 뇌건강의 연결고리를 밝히다
- 같은 농도의 탄소 미세먼지도 구조에 따라 뇌에 끼치는 영향이 상이 <p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 " id="SE-3c78355e-590f-4353-9549-3d48007bb580" style="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0px; line-height: 1.5; font-family: se-nanumgothic, "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color:="" rgb(60,="" 63,="" 69);=""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justify="" !important;"="">- 이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 발견-향후 뇌질환 치료제 개발로 응용 기대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연구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등 성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해 정확한 대처나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중 20~50%를 차지하고 있는 탄소 미세먼지의 경우 0~3차원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으나 ‘탄소류’라는 한 개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흡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만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 윤석진) 생채재료연구센터 이효진 박사, 도핑콘트롤센터 김기훈 박사, 뇌과학창의연구단 김홍남 박사 연구팀은 탄소 나노입자의 구조를 제어해 같은 탄소 성분이더라도 구조에 따라 생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뇌 손상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굴했다. 연구진은 탄소 미세먼지와 유사한 다양한 차원(0~3차원)의 탄소 나노재료를 합성해 국내 초미세먼지 기준 ‘나쁨’에 해당하는 농도(50μg/m3)로 신경세포에 처리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0차원 탄소입자는 장기간 노출시에도 신경세포의 과활성이나 사멸을 유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차원(3차원)의 탄소입자는 단기간(72시간 이내)의 노출만으로도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활성상태를 유도해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었으며, 장기간(14일) 노출시 신경세포는 사멸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존재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이더라도 일반인 보다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더욱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고차원 탄소입자가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유도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Snca 유전자가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전자 가위 방법을 통해 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동일한 농도의 탄소 미세먼지를 처리하자 비정상적 신경 과활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전 핵심 인자 발굴은 미세먼지에 농도에 따른 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물질 도출 및 약물 개발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T 이효진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가 뇌에 특히 퇴행성 뇌질환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세먼지가 다양한 조직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지원으로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Biomaterials’ (JCR 분야 상위 2.778%)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Effect of carbon nanomaterial dimension on the functional activity and degeneration of neurons - (제 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찬 위촉연구원, 황경섭 학생, 임누리 학생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효진, 김기훈, 김홍남 선임연구원 그림 설명
미세먼지와 뇌건강의 연결고리를 밝히다
- 같은 농도의 탄소 미세먼지도 구조에 따라 뇌에 끼치는 영향이 상이 <p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 " id="SE-3c78355e-590f-4353-9549-3d48007bb580" style="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0px; line-height: 1.5; font-family: se-nanumgothic, "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color:="" rgb(60,="" 63,="" 69);=""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justify="" !important;"="">- 이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 발견-향후 뇌질환 치료제 개발로 응용 기대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연구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등 성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해 정확한 대처나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중 20~50%를 차지하고 있는 탄소 미세먼지의 경우 0~3차원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으나 ‘탄소류’라는 한 개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흡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만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 윤석진) 생채재료연구센터 이효진 박사, 도핑콘트롤센터 김기훈 박사, 뇌과학창의연구단 김홍남 박사 연구팀은 탄소 나노입자의 구조를 제어해 같은 탄소 성분이더라도 구조에 따라 생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뇌 손상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굴했다. 연구진은 탄소 미세먼지와 유사한 다양한 차원(0~3차원)의 탄소 나노재료를 합성해 국내 초미세먼지 기준 ‘나쁨’에 해당하는 농도(50μg/m3)로 신경세포에 처리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0차원 탄소입자는 장기간 노출시에도 신경세포의 과활성이나 사멸을 유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차원(3차원)의 탄소입자는 단기간(72시간 이내)의 노출만으로도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활성상태를 유도해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었으며, 장기간(14일) 노출시 신경세포는 사멸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존재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이더라도 일반인 보다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더욱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고차원 탄소입자가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유도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Snca 유전자가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전자 가위 방법을 통해 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동일한 농도의 탄소 미세먼지를 처리하자 비정상적 신경 과활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전 핵심 인자 발굴은 미세먼지에 농도에 따른 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물질 도출 및 약물 개발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T 이효진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가 뇌에 특히 퇴행성 뇌질환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세먼지가 다양한 조직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지원으로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Biomaterials’ (JCR 분야 상위 2.778%)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Effect of carbon nanomaterial dimension on the functional activity and degeneration of neurons - (제 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찬 위촉연구원, 황경섭 학생, 임누리 학생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효진, 김기훈, 김홍남 선임연구원 그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