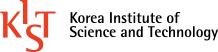Result
게시물 키워드""에 대한 9495개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징용 사진 답변 요망!
일본 탄광에서 졸업 사진처럼 찍힌(인터넷에서 떠 도는 사진,1940년대) 외조부 인물 사진과 1960년대 돌아가시기 전 사진들을 대조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내 드릴테니 도움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대조 사진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공용 폰을 알려 주시면) AI 기술로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판별할 수는 없나요? 연구원님들은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시어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징용 사진 진위 여부 판별
이번 기시다 일본 총리께서 방한 하시고 일제 강점하 일본으로 끌려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언급 하셨는 데, 저희 돌아가신 외조부께서도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탄광에서 조센징이라고 엄청 맞고 해방 후 국내로 송환되어 1960년대 고문 후유증으로 보상도 없이 돌아 가셨는 데, 요즘 인터넷에 떠 도는 징용공 탄광 사진들이 많이 올라 오는 데, 여럿이 찍은 졸업 사진 같은 일제 강점하 일본 탄광 조선인 인부들 사진 속에서 저희 외조부 사진을 발견 했으나(인터넷 검색) 그 분이 저희 외조부인지 살아 생전 사진과 대조해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하는 첨단 방법은 없는지요? 돌아가신 외조부 명예나마 회복 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
차세대 ‘리튬-황’ 이차전지, 수명·성능 향상 기술 개발
-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물질로 전극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구현 -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등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적용 기대 리튬-황(Lithium-Sulfur battery)전지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전지보다 대략 8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져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리튬이온전지를 상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2차전지이다. 하지만 황(octa-sulfur)을 양극으로,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리튬-황전지의 구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진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 artificial solid-electrolyte interphase)을 사용하여 리튬-황 전지의 성능과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녹색도시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은 ‘무인 이동체’를 구동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전지의 이온 보호막으로 사용, 리튬 음극과 황 양극의 안정화를 끌어내어 고성능 리튬-황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리튬-황 전지의 단점은 양극으로 사용하는 황의 낮은 전기전도도와 반응생성물인 부도체(Li2S)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생성물인 리튬폴리설파이드(LPS, Li2Sn 2<n<8)라 불리는 중간 종의 형성에 있다. 이 물질들은 전극 물질의 손실과 낮은 재이용율 문제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전지의 용량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충·방전 수명이 짧아지며, 화학적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충·방전 시 음극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과 불균일한 전착이 과열, 전해액 분해, 리튬 손실을 야기한다. 충전과정에서 리튬이온의 불균일한 전착은 분리막을 꿰뚫게 되는 이른바 ‘덴드라이트’(Dendrite, 수상돌기) 성장이 일어나 많은 열과 스파크를 일으켜 가연성 유기물인 전해액의 발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져온다. KIST 연구진은 리튬-황 전지의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공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공 고체-전해질 중간물질(ASEI)을 제조하여, 음극(-)에서 리튬의 안정한 도금을 형성하여 단점을 상쇄하는 원천적 메커니즘을 밝혔다.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양극(+)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황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체-전해질 중간상(ASEI)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제조한 고성능 리튬-황전지가 1,000회 이상의 안정적인 충·방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용량이 3배 가량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전지의 오랜 수명과 고출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를 주도한 KIST 조원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개발한 리튬-황 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출력이 높아 향후 드론, 자율주행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지원으로 ‘무인이동체 사업단’ 사업과 K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 ‘Nano Energy’ (IF:12.34)에 10월 7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n<8)라 안전문제를="" 심각한="" 일으키는="" 발화를="" 전해액의="" 유기물인="" 가연성="" 스파크를="" 열과="" 많은="" 일어나="" 성장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dendrite,="" 이른바="" 되는="" 꿰뚫게="" 분리막을="" 전착은="" 리튬이온의="" 충전과정에서="" 야기한다.="" 손실을="" 리튬="" 분해,="" 전해액="" 과열,="" 전착이="" 불균일한="" 반응성과="" 높은="" 리튬의="" 음극인="" 시="" 문제는="" 다른="" 또="" 된다.="" 발생하게="" 단락이="" 화학적="" 짧아지며,="" 수명이="" 충·방전="" 감소하거나,="" 빠르게="" 용량이="" 전지의="" 결과로="" 그="" 일으켜="" 문제를="" 재이용율="" 낮은="" 손실과="" 물질의="" 전극="" 물질들은="" 이="" 있다.="" 형성에="" 종의="" 중간="" 불리는="" div="" 가져온다.?<=""> <그림설명> <그림 1> 인조 고체-전해질 중간상을 적용한 고성능 리튬-황전지 개념도 </n<8)라>